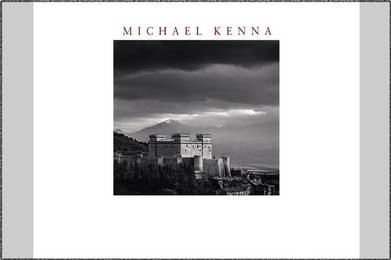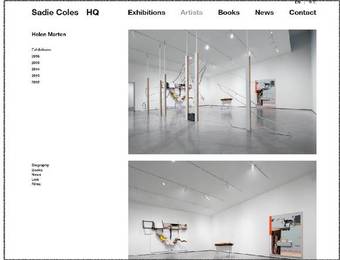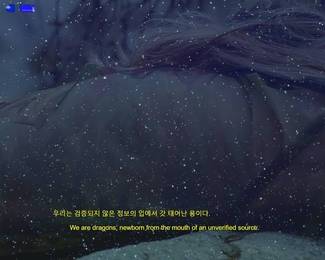‘물방울 화가’ 김창열,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물방울이 갖는 의미는?
초기 앵포르멜 회화부터 물방울 통해 확립한 독자적 작품세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소개
다아트 안창현 기자 2014.04.18 08:21:02
‘종 Bell’, 캔버스에 오일, 아크릴, 81×100cm, 2003, 작가소장. (제공=광주시립미술관) 김창열 화백. (제공=광주시립미술관)
김창열 화백은 쉼 없이 다양한 물방울을 그려왔다. 밤하늘 아래 이슬처럼 바닥에 곧 떨어질 듯한 물방울, 수정처럼 동그랗게 마대 위해 놓인 물방울, 이미 마대 천위에 스며든 흔적을 남긴 물방울 등 그가 그린 물방울의 모습은 어느것 하나 닮지 않았다.
김창열 화백의 초기 작품부터 ‘물방울’이 탄생하기까지, 또 물방울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확장시켜 온 최근작까지 그의 시기별 대표작들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전시 ‘김창열 Kim-Tschang-Yeul’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다.
김 화백은 1958년 현대미협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며 1960년대 중반까지 앵포르멜 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한국전쟁에 의한 파괴와 참극을 겪으면서 시대의 폭력에 의한 좌절과 절망감을 비정형 회화로 표현했다. 어두운 색채로 화면을 가로지르며 물감의 흔적을 두텁게 남긴 ‘제사’(1964~65) 연작 등 당시의 작품들은 한국전쟁의 상흔을 담았고 죽은 넋을 달래는 일종의 제사였다.
전쟁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육화된 초기의 작품에서 1970년대로 넘어오며 김 화백의 작품에는 명확하게 정리된 선과 형상, 밝은 색채 등 작품세계의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물’이 그의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자리잡는다. 물은 신체를 정화하고,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에게는 이전의 암담함,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승화의 상징물이었다.
‘제전’(1970) 이후 그는 점차 물방울의 이미지에 근접한 ‘현상’(1971) 연작을 제작했다. 그리고, 깜깜한 밤하늘에 생명수처럼 반짝이는 물방울을 그린 ‘밤’(1972)을 프랑스 파리의 살롱드메에 출품하고 1973년 파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물방울 화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특히, 물방울과 바탕 화면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바탕을 칠하지 않은 거친 마대의 표면을 이용해 그 위에 물방울을 표현하는가 하면, 거친 모래의 배경이나 천자문으로 겹겹이 뒤덮인 표면 등에 물방울을 그려넣기도 했다.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과 이런 대조적인 화면은 그가 그린 물방울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보이게 했다.
김 화백의 물방울은 ‘전쟁의 망자를 위한 진혼곡’이면서 ‘또다른 탄생을 위한 정화’의 물방울로 해석되면서 “물방울이라는 소재를 통해 동양의 정신을 현대미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초대전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몸소 겪으며 초창기 한국화단의 기반을 다졌고, 나아가 국제무대에 일찍이 진출해 그 활동 영역을 넓힌 김창열 화백의 폭넓은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5월 6일까지.
안창현 기자 isangahn@cnbnews.com
다아트 TWITTER

-
[전시 취재 요청]온/오프라인 프로젝트로…
-
[전시 취재 요청]박장배 'Obsession…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2020하반기 공…
-
[전시 취재 요청]MoPS 삼청별관 《Port…
-
[전시 취재 요청]한미사진미술관 소장품전…
-
[전시 취재 요청]2020 하반기 갤러리도스…
-
[전시 취재 요청]2020년도 금호창작스튜디…
-
[전시 취재 요청]2020하반기 갤러리도스 공…
-
[전시 취재 요청]2020하반기 공모전 '흐름…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김수진 '…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강민주 '…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 도스 기획 맹혜영…
-
[전시 취재 요청][누크갤러리] 강홍구, 유…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권지은…
-
[전시 취재 요청][금호미술관] 김보희 초…
-
[기타 행사 보도 요청][아트선재센터] 웹사이…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조재형 '…
-
[전시 취재 요청]김희조 BYR : Prime El…
-
[전시 취재 요청]2019 예비 전속작가제 결…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백신혜 '…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이진아 '…
다아트 추천 동영상
- William Kentridge, 'What Will Com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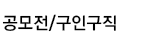






![[신간]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data/cache/public/photos/20210938/art_140312_1632377239_173x135.jpg)
![[신간] 미술비평 - 비평적 글쓰기란 무엇인가](/data/cache/public/photos/20210938/art_140305_1632363928_173x135.jpg)
![[신간] 널 위한 문화예술](/data/cache/public/photos/20210937/art_140262_1631847401_173x135.jpg)
![[이문정 평론가의 더 갤러리(75) 작가 권오상 ‘조각의 시퀀스’] “코로나 이후 사진조각의 실험성을 확장”](/data/cache/public/photos/20210937/art_140204_1631593450_173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