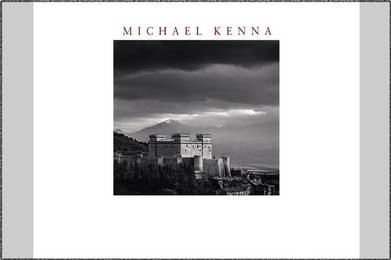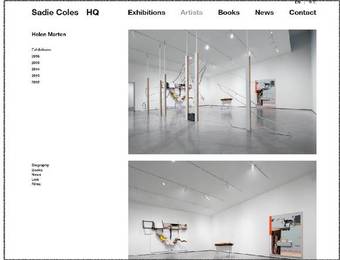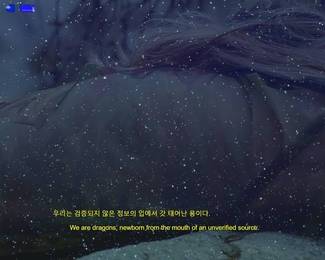눈에 익은 사물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화병에 꽂힌 가지런한 꽃송이, 장식이 거의 없는 단정한 주발, 거짓 없이 소박한 모양의 과일, 색도 말도 없이 묵묵히 둘러쳐진 기와들. 모두가 강미선(50) 작가의 손을 거쳐 세상에 공개된 것들이다. 열네 번째의 작품전을 1일부터 14일까지 롯데갤러리 본점에서 갖는 강 작가는 “근 5년 만에 갖는 전시에 이것저것 모으다 보니 작품들이 꽤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라며 “종이라는 재질에 먹의 농담을 사용해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꺼냈다. 강 작가는 최근 현대미술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한지에 주목을 한다. 약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세간의 이야기 때문이지만, 본인은 손을 통해 한국적이고 실용적 기능이 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 주요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누구나 만나는 세계의 사물이지만 작가가 보이는, 보여주는 세계의 사물은 이미 다른 의미의 표상이다. 지난 몇 년 간 작가는 ‘나의 방’ 연작을 통해 ‘관심’이란 명제를 제기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을 향한 의식의 지향적 태도로서의 그 관심은 하이데거의 ‘괘념’과 상통한다. 강미선의 ‘나의 방’에서 드러나는 일체의 물상들은 바로 작가 자신을 가장 가까이 가족과 지인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일련의 세계를 무관심하듯 의식하며 배려하는 작가의 삶의 태도가 그대로 묻어있는 명제로 ‘관심’을 끈다. 이번전시에는 한지와 수묵의 질료도 빚어내는 작가의 그림은 때로는 한지의 속성으로 하여 때로는 붓질의 운행으로 하여 정갈하면서도 견고한 느낌을 특징으로 한다.

강 작가는 한지에 대한 애착과 적극적인 실험을 꾸준히 해오면서 질료적 속성을 스스로 응용하며 자신의 빛깔을 만들어왔다. 가장 부드러운 지점에서부터 가장 질긴 생명성을 발현해내는 그의 집요하고 은근한 내성이 한지의 그것과 닮아 있음을 보게 된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기존의 한지 작업과 함께 방금 구워낸 도판 작업도 함께 선을 보인다. 일상의 물상으로서의 대상성 뿐 아니라 작가의 인연들 가운데 매개적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기, 식기, 화기 등과 같이 일상에서 함께 하는 그릇이자, 가까운 지인들이 만져온 흙이라는 재료의 친숙함이 작업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다아트 TWITTER

-
[전시 취재 요청]온/오프라인 프로젝트로…
-
[전시 취재 요청]박장배 'Obsession…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2020하반기 공…
-
[전시 취재 요청]MoPS 삼청별관 《Port…
-
[전시 취재 요청]한미사진미술관 소장품전…
-
[전시 취재 요청]2020 하반기 갤러리도스…
-
[전시 취재 요청]2020년도 금호창작스튜디…
-
[전시 취재 요청]2020하반기 갤러리도스 공…
-
[전시 취재 요청]2020하반기 공모전 '흐름…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김수진 '…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강민주 '…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 도스 기획 맹혜영…
-
[전시 취재 요청][누크갤러리] 강홍구, 유…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권지은…
-
[전시 취재 요청][금호미술관] 김보희 초…
-
[기타 행사 보도 요청][아트선재센터] 웹사이…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조재형 '…
-
[전시 취재 요청]김희조 BYR : Prime El…
-
[전시 취재 요청]2019 예비 전속작가제 결…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백신혜 '…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이진아 '…
다아트 추천 동영상
- William Kentridge, 'What Will Com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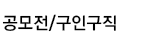






![[신간]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data/cache/public/photos/20210938/art_140312_1632377239_173x135.jpg)
![[신간] 미술비평 - 비평적 글쓰기란 무엇인가](/data/cache/public/photos/20210938/art_140305_1632363928_173x135.jpg)
![[신간] 널 위한 문화예술](/data/cache/public/photos/20210937/art_140262_1631847401_173x135.jpg)
![[이문정 평론가의 더 갤러리(75) 작가 권오상 ‘조각의 시퀀스’] “코로나 이후 사진조각의 실험성을 확장”](/data/cache/public/photos/20210937/art_140204_1631593450_173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