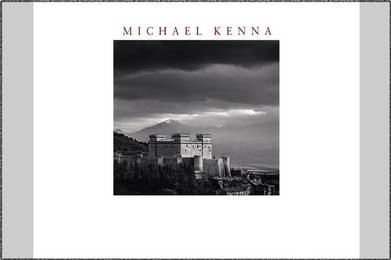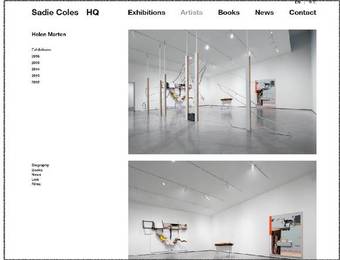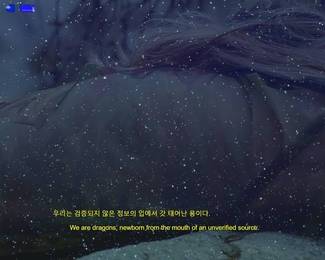2007년 뉴욕. 사진과 역사를 공부하던 한 남자가 유실물 경매에서 십 수만 장이나 되는 필름을 헐값에 구입했다. 참고 자료로 쓰려고 사진을 살펴보던 그는 그 많은 사진이 모두 한 사람이 찍은 것이고, 게다가 천재적인 걸작 사진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이 작품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수수께끼의 사진작가에 관해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 뉴욕과 시카고 등에서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보며 산 보모였다. 수십 년을 가족도 없이 돌보는 아이의 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2009년 한 요양병원에서 외톨이로 죽었다. 그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하루 종일 사진기를 목에 걸고 돌아다니며 동네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시간을 필름에 담았다.
그런데 비비안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기억은 숨기는 게 많은 괴짜였다. 사람들은 비비안이 항상 사진을 찍고 다니긴 했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은 없었다고 술회했다. 새 아이를 맡을 때마다 그 많은 필름들을 싸들고 이사를 다녔다. 나이가 든 후에 일자리와 거처가 마땅치 않게 되자 임대형 창고를 빌려 보관했다. 그리고 더욱 늙고 병든 그녀가 보관료를 오랫동안 내지 못한 채 잠적하는 바람에, 창고 주인은 그녀의 필름을 경매로 처분해야 했던 것이다.
비비안 마이어는 이처럼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의 삶 또한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비비안 마이어 사진전은 세계 주요 대도시, 대형 전시장에서 열리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고,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다. 비비안 마이어가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그녀의 사진이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삶과 사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가진 힘 덕분이다.
‘나는 비비안의 사진기’는 비비안 마이어의 이야기와 사진을 소개하는 그림책이다. 책의 화자는 사진기다. 비비안이 평생 메고 다니며 수만 장의 사진을 찍는 데 사용한 롤라이플렉스(Rolleiflex) 사진기의 시점에서 비비안의 삶과 사진에 얽힌 추억들을 들려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만화가이자 동화작가인 친치아 기글리아노(Cincia Ghigliano)는 비비안을 둘러싼 미스터리보다, 평범했던 그녀가 세상을 향해 가졌을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더 주목했다. 어린이가 이 책을 읽는다면, 사진이라는 예술과 작가의 삶을 더 친근한 것으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비비안의 대표적 작품들을 토대로 그려진 삽화에는 흑백 사진의 매력이 잘 표현됐고, 생생하게 살린 재료의 질감 때문에 따듯함이 더해졌다. 비비안과 그녀의 사진기가 포착한 시간과, 그 시간을 살았을 사람들의 그림을 보다보면,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독자에게도 아련한 향수가 전해온다.
친치아 기글리아노 지음, 유지연 옮김 / 1만 1000원 / 지양어린이 펴냄 / 32쪽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다아트 TWITTER

-
[전시 취재 요청]온/오프라인 프로젝트로…
-
[전시 취재 요청]박장배 'Obsession…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2020하반기 공…
-
[전시 취재 요청]MoPS 삼청별관 《Port…
-
[전시 취재 요청]한미사진미술관 소장품전…
-
[전시 취재 요청]2020 하반기 갤러리도스…
-
[전시 취재 요청]2020년도 금호창작스튜디…
-
[전시 취재 요청]2020하반기 갤러리도스 공…
-
[전시 취재 요청]2020하반기 공모전 '흐름…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김수진 '…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강민주 '…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 도스 기획 맹혜영…
-
[전시 취재 요청][누크갤러리] 강홍구, 유…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권지은…
-
[전시 취재 요청][금호미술관] 김보희 초…
-
[기타 행사 보도 요청][아트선재센터] 웹사이…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조재형 '…
-
[전시 취재 요청]김희조 BYR : Prime El…
-
[전시 취재 요청]2019 예비 전속작가제 결…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백신혜 '…
-
[전시 취재 요청]갤러리도스 기획 이진아 '…
다아트 추천 동영상
- William Kentridge, 'What Will Com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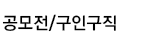






![[신간] 널 위한 문화예술](/data/cache/public/photos/20210937/art_140262_1631847401_173x135.jpg)
![[이문정 평론가의 더 갤러리(75) 작가 권오상 ‘조각의 시퀀스’] “코로나 이후 사진조각의 실험성을 확장”](/data/cache/public/photos/20210937/art_140204_1631593450_173x135.jpg)

![[이문정 평론가의 더 갤러리 (74) 작가 안네 임호프] “내 작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관객이 정한다”](/data/cache/public/photos/20210835/art_140015_1630287939_173x135.jpg)